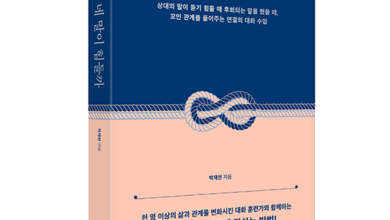[책 리뷰] 감각의 불확실성 ‘눈’
‘보는 것 만큼 안다’,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세상을 알기 위해 때로는 세계여행을 하고 많은 것은 보기 위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보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눈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살펴 보자.


사람이 사물을 보는 과정은 위 사진과 같다.
위와 같이 먼저는 눈으로 시각 정보를 받아 뇌(후두엽)에서 정보를 분석하여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지금 뇌(후두엽)에서 정보가 분석되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뇌는 이 정보를 저장 곧 아는 것이 된다.
Q. 하나의 사물을 여러 사람이 보았을 때 모두 같은 사물로 기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생물학적인 감각체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는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예로 프레임의 내용 중 ‘감각의 불확실성’을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하는 여러 경험들 가운데 감각적 경험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
어떤 논쟁에서도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내가 직접 먹어봤다니까!”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다. 아무리 정교한 논리와 해박한 이론을 동원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경험했다는 주장 앞에서는 기를 펼 수가 없다. 게 맛에 대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직접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니들이 게 맛을 알아?”라는 면박 앞에서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감각적 경험에도 놀랄 만큼 애매성이 존재한다.
다음 그림의 정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를 한 번 보자. 알파벳 A,B,C 가 보일 것이다.

이제 A와 C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좌우를 한 번 보자. 분명 12, 13, 14가 보일 것이다.
어떻게 해서 정가운데 있는 것은 B로도 보이고, 13으로도 보이는 것일까? 동일한 모양이지만 위아래로 읽을 때는 주변에 알파벳이 배역되어 있어서 ‘글자 프레임’이 활성화되고, 좌우로 읽을 때는 주변에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숫자 프레임’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동일한 시각 자극이었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실체(글자와 숫자)로 경험될 만큼 이 자극을 애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적 경험도 항상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레임에 따라 달리 경험될 수 있는 본질적 애매성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도서 프레임을 통해 감각적 경험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상황을 한 번쯤경험해 보았을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제 2편에 이어서-